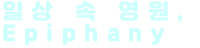2018. 7. 6. 18:00ㆍ여행기/북유럽 미니벨로 여행기
구름 낀 스톡홀름
오늘 아침은 전날 사 놓은 닭다리 두개와 자두알. 자두가 얼마나 시던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안에서 맛이 느껴진다. 아침을 먹는데 어제 잠시 만난, 홍콩에서 마커스가 다가온다. 같이 마주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였다. 같은 나이로 보이는 마커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빠지기 전에 여행을 한다고 한다. 마커스의 천도 복숭아와 자두 두알을 바꿨는데 나의 신 자두와 다르게 천도복숭아는 달다. 마커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틴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마틴은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오후 1시경 차를 타고 독일로 돌아간다고 하여 작별 인사를 하였다. 고맙게도 마틴이 가면서 토틸리아니와 토마토 소스 등 남은 요리재료를 주고 갔다.
원래 오늘의 계획은 오전 10시에 있는 시티투어와 오후에 있는 투어 둘 다 참가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슬로에서 묶을 장소를 예약하다가 오전 시간이 다 계획이 틀어졌다. 점심을 먹을 즈음에 노르딕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 국립 미술박물관은 무료. 하루종일 날이 흐려서 그런지 스톡홀름의 거리도 무채색으로 보이지만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SALONG K-STYLE이라, 한국 화장품을 파는 곳인가?
저번에 핀란드 투르쿠에서 캠핑할 때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침낭을 하나 새로 구비할까 고민을 하는 중이다. 마침 미술관 가는 길 중간에 캠핑 도구를 파는 상점이 있어서 들어가 침낭을 보기로 했다. 2층까지 캠핑 도구로 꽉 차 있어 구경을 하였다. 여러 제품들을 부면서침낭 위에 커버처럼 덮어서 오염방지에 온도를 올려주는 제품도 발견했지만 어림없을 것 같았다. 20L 용량의 물주머니도 판다. 필요할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구경만 하였다. 2층에는 침낭을 파는 코너가 있다. 혼자 고르기는 어려워서 그곳에 있던 점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역시 북유럽이라 그런지 영어를 잘한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친절하게 침낭에 관련해서 알려주면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본다. 노르웨이 트론헤임까지 올라가서 자전거로 내려올거라고 말해주었다. 185cm는 넘어 보이는 점원은 내 키를 보더니 185cm 정도 되어 보인다며 중간 사이즈를 추천해준다. 너무 관대하다 하하하하. 점원은 피엘라벤의 무브 백이라는 침낭을 추천해준다. 무브 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침낭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기도 수월하고 적정 온도도 대략 0도에 부피도 내가 가져온 초경량 침낭과 비슷한 제품이다. 문제는 이 침낭의 가격이 거의 40만원을 육박하는 것이다. 설명을 다 들어본 다음에 혼자 한국에서의 가격을 확인해보니 별차이가 없다. 원산지에서 사는데도 메리트가 없다니. 일단 더 둘러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상점에서 나왔다.
길을 걷다 보니 옆에 영화관도 있어서 스웨덴은 영화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경하기 했다. 내부는 한국처럼 모던하고 세련된 것은 아니었다. 옆에 있는 티켓머신에서 무슨 영화가 있는지 보았다. 상영하는 영화 원더우먼과 덩케르크, 그리고 아마도 자국영화들. 덩케르크를 재밌게 봐서 얼마일까 하고 눌러보니 한명 당 135크로나이다. 한화로는 대략 18000원. 상당히 비싸다. 이정도면 스웨덴인들도 영화를 아무 때나 못 볼 것 같다.
이번에 자전거를 타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또 다른 것은 스마트폰 거치대이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길을 찾을 때 지도는 필수이다. 특히 도시 같은 복잡한 곳에서는 안 볼 수가 없다. 여태껏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앞 가방에 넣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한손으로 들고 탔는데 떨어트릴까 여간 불안하게 아니었다. 헬싱키에 있을 때는 앞 가방에 빼기 쉽게 넣어둔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떨어트렸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친절하게도 주서준 적도 있다 그런 이유로 스마트폰 자전거 거치대를 찾으러 여러 상점을 돌아다녔다. 자전거를 취급하면서 커피를 같이 파는 카페도 보고 자전거만 파는 가게도 들어가봤지만 매우 간단하게 생긴 것이 4만원이나 한다.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나왔다.
길을 가는데 거리의 광장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동남아 관련 축제이다. 가수가 와서 노래도 부르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인지 사람이 별로 없다. 비가 하루종일 와서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하였다.
계속 걷다 보니 NK백화점가 보인다. 스톡홀름에서 유명한 장소로 여행책자마다 소개되는 백화점이라 잠시 들려 구경을 하였다. 생각보다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전에 방문했던 일본의 백화점이 훨씬 세련되게 잘해 놓고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백화점에서 나오니 오후 3시가 넘어간다.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박물관을 가기에는 시간이 늦어져 다시 감라스탄으로 향하였다. 스톡홀름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핫도그를 파는 것이 보이는데, 파는 사람들은 다 스웨덴 본토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감라스탄 입구에서도 아랍이나 동유럽에서 온 것 같은 아저씨가 핫도그를 팔기에 15크로나, 한화로 대략 2000원을 주고 제일 싼 핫도그를 하나 사 먹었다. 맛은 나쁘지 않다. 4시 쯔음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비가 그쳤다.
오슬로로 가는 버스가 밤 10시 35분에 있어서 갈 준비를 하러 숙소로 가기로 하였다. 호스텔 달라가탄의 장점은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다. 체크아웃하는 날 당일 오후 6시까지 짐을 보관을 할 수 있어 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오후에는 직원이 퇴근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안보고 부엌을 쓸 수 있다. 숙소로 가면서 마트에 가 남은 스웨덴 크로나로 닭다리를 사와 저녁으로 먹었다. 그런 후에 떠나기 전까지 밀린 일기를 쓰기로 하였다. 어느 정도 쓰던 도중 네덜란드에서 온 체리Tjerk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았다. 키도 꽤 훤칠한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이 저녁으로 먹던, 누텔라와 치즈를 올린 빵을 나에게 권한다. 내가 일기 쓰는 것을 보더니 글씨를 알아보고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친구도 한국인이라고 덧붙인다. 그 옆에 있던 친구도 체리 만큼이나 키가 큰 흑인이다. 내가 있어서 그런지 옆에 있는 친구와 네덜란드어로 대화를 안하고 영어로 한다. 아무래도 억양은 있지만 영어로도 네덜란드에서 같이 온 친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오늘 스톡홀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보니 매일 일기를 쓴다. 알파벳의 도장도 가지고 다니면서 각 도시명과 날짜를 그것으로 찍고 있어서 나도 빌려서 내 일기에 찍었다.
어느덧 갈시간이 되어 자전거에 짐을 실었다. 알베르토가 짐을 보더니 이것 밖에 없냐고 놀란다. 45L 백팩 하나와 텐트, 그리고 자전거를 담는 천가방을 자전거에 싣는다. 거기에 항상 차고 다니는 웨이스트백을 허리에 차고 음식이 든 주머니를 앞 핸들바에 걸어서 다니는데 다름 사람에 비해 짐이 정말 적다고 할 수 있다. 백팩은 말이 45L이지 부가 주머니의 용량을 모두 합친 크기라 사실은 45L보다 훨씬 덜 들어가는 가방이었다. 그래도 만듬새가 튼튼하고 좋긴 하였지만. 대만인 도니 양 아저씨와 알베르토가 옆에서 짐을 다 실은 내 사진을 찍고 배웅을 해주었다. 양 아저씨는 매우 아쉬워한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자전거를 타고 비에 젖은 거리를 따라 버스 터미널을 향하였다.
스톡홀름은 마천루는 없지만 그래도 차도 많이 다니는 큰 도시다. 오슬로 센트럴 스테이션 안에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꽤 넓다. 오슬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야 할 곳을 찾아 갔다. 내가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오슬로로 이동할 때 이용한 버스는 swebus이다. 버스 티켓을 swebus홈페이지에서 샀는데 영어로도 되어서 수월하다. 버스를 원래 한 사람 당 409 크로나인데 자전거까지 해서 100크로나를 추가로 냈다. 한화로 환산하면 69000원. 하지만 탈 때는 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탔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스웨덴인이 아닌, 아랍이나 아프리카계의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버스의 옆자리에는 오슬로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저씨가 앉았다. 원래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티켓이 없었다고 한다. 인사를 한 후 자려고 하였다. 의자가 딱히 부드럽지도 않고 넓은 것도 아니어서 새우잠을 잤다. 스톡홀름에서 2박 3일 정도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서 그런지 떠날 때는 아쉬웠다. 스톡홀름을 떠나는 옆 풍경이 길고 가는 나무들이 많은게 헬싱키를 떠날 때인지 분간이 힘들다. 그렇게 스톡홀름을 떠났다.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여행기 > 북유럽 미니벨로 여행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잠시 쉬어가기 - 북유럽 자전거 여행 영상 (0) | 2018.07.08 |
|---|---|
| 북유럽 미니벨로 여행 6. 오슬로 (0) | 2018.07.07 |
| 북유럽 미니벨로 여행기 4. 독일인 교육자와 하루 동행: 바사와 감라스탄 (0) | 2018.02.15 |
| 북유럽 미니벨로 여행 3. 바다 건너 스톡홀름에서 만난 사람들 (1) | 2018.02.14 |
| 북유럽 미니벨로 여행 2. 헬싱키 시내와 투르쿠, 그리고 첫 캠핑 (0) | 2018.02.13 |